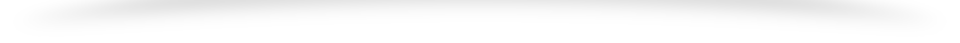미국의 저명한 자연작가 데이비드 조지 해스컬은 신작 ‘야생의 치유하는 소리’에서 새의 지저귐과 개구리의 울음, 곤충의 날갯짓에 주파수를 맞추고 귀를 기울이는 일이야말로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 부서진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게티이미지뱅크
■ 야생의 치유하는 소리
데이비드 조지 해스컬 지음│노승영 옮김│에이도스
35억년의 침묵 깬 생명의 소리
생물의 생존·번식에 영향 끼쳐
새의 지저귐과 곤충의 날갯소리
인간의 언어·음악과 본질 같아
코로나가 촉발한 전지구적 고요
잃어버린 자연의 소리 되찾게 해

해수면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지,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푸른 숲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수많은 통계 수치와 함께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숱하게 들어도 사람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자연은 보면 좋고, 아름답고, 지구가 아프다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사라질 거라는 경고에는 잠시 안타까워지기는 하지만 이내 눈을 감는다. 어쩐지 내가 직면한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절박함에도 꿈쩍하지 않는 무미건조한 마음, 환경윤리를 실천하기엔 아직 모자란 동기와 용기…. ‘나무의 노래’ ‘숲에서 우주를 보다’로 잘 알려진 미국의 자연작가인 데이비드 조지 해스컬은 안다. 지구의 일을 ‘남의 일’로만 느끼는 여기, 우리의 흔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말이다. 2023 퓰리처상 논픽션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른 해스컬의 신작은 그런 책이다. 숫자나 뉴스가 할 수 없는 것을, 기어코 해낸다. ‘소리’를 매개로, ‘감각적’으로 우리를 자연과 다시 연결시킨다. 소리의 진화를 “45억 년 지구 역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경이로운 장면”이라고 말하며.
소리가 없었던 지구에서 35억 년의 침묵을 깬 ‘생명의 소리’가 어떻게 출현했을까. 그 ‘처음’으로 추정되는 귀뚜라미 화석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책은 한마디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 부서진 관계를 복원하는 생물학자의 대서사시다.
저자는 탁월한 과학적 통찰력과 야생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소리’가 어떻게 경이이자, 창조이며, 치유인지 설파한다. 생물의 생존과 번식에서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 인간의 소음으로 뒤덮인 이 지구가 왜 개인을 고립시키고,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며, 생명의 생태적 회복력과 진화적 창의성을 약하게 하는지 말이다. 나아가 ‘잃어버린 주파수’를 찾는 실질적이고 윤리적인 행위에 이르기까지.
‘소리’를 진화적 관점으로 풀어내는 책은 신선하고 낯설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반복적인 수치가 아니라 새로운 ‘감각’이었는지 모른다. 여기에, ‘소리’가 존재하는 장면들은 가깝고 익숙해 더 설득력을 갖는다. 가만 떠올려 보라. 생물 종은 모두 소리로 소통한다. 포식자를 피하기도 하고, 번식을 위해 짝에게 구애하기도 하며. 예컨대 개구리의 울음은 공기 진동을 일으키며 퍼져 나가고, 이 울음을 들은 다른 개구리는 신경계에 새겨진 지식을 상기하고, 자신의 상황을 이해한다. 지금 이 순간이 생명이 위험한 때인지, 아니면 사랑을 해야 하는 때인지. 저자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생명 진화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굴리는 원동력이 바로 소리를 통한 “성적 과시와 미적 경험의 공진화”라고 단언한다. 또한 이들이 서로의 노래를 듣고 성적 선호를 표현하고 번식으로 이어지는 것과, 우리가 언어로 소통하고 음악을 듣고 아름다움을 비롯해 여러 감정을 느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인다. ‘짹짹’ ‘개굴개굴’. 새의 지저귐과 개구리의 울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의 듣기 힘들어진 희귀한 곤충의 날갯소리, 수천㎞ 밖까지 전달된다는 고래의 노래가 인간의 언어, 그리고 음악과 그 역할과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이다.
저자를 비롯해 수많은 과학 저술가들과 연구자들이 난데없이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된 것은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로 인한 ‘단절’이 추동한 현상이다. 지구 표면 1㎞ 아래까지 침투하는 출퇴근 시간대 도시의 우렁찬 소리가 봉쇄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멈췄던 시기. 전염병을 막기 위해 씌워진 마스크는 인류를 침묵하게 했고, 잊고 지낸 ‘고요’가 무엇인지 알게 했다. 잃어버렸던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되찾게 되자, 사람들은 감탄했다. 봄에 나는 새소리, 여름 저녁 곤충의 우는 소리, 활기찬 개구리의 합창이 섬이 돼 버린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메우는 치유의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책은 “전례 없는 지구적 고요” 속에서 인간이라는 단일 종이 만들어낸 소음이 얼마나 지배적이었는지도 지적하는데, 결국 우리가 자연을 향한 주파수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문명이라는 ‘벽’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클릭 한 번에 배달되는 인터넷 쇼핑과 비대면으로 가능한 업무의 확대 등 저자는 “인간이 만든 문명과 도시 안에서 누리는 풍요”가 반대로 “파괴와 빈곤의 다른 면”이라면서 단절과 고립, 개인주의와 윤리적 허무주의, 그리고 감각적 소외를 타파하기 위해 다시 한번 ‘소리’를 강조한다.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한다. 들으라는 것이다.
우리 곁에 사는 생물 종, 그것이 인간이든 다른 생명이든, 어떻게든 ‘감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라는 것이다. 웃음으로 울음으로, 언어와 음악으로. 608쪽, 3만3000원.